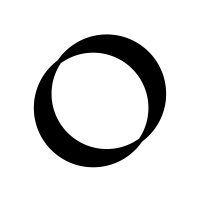
코오롱인더스트리㈜ FnC부문
- 대표이사
- 유석진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8
- TEL
- 1588-7667 (유료)
- kolonmall@kolon.com
- 통신판매업신고
- 제 2017-서울강남-02297호
- 사업자등록번호
- 138-85-19612

코오롱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유효기간 2023. 10. 04 ~ 2026. 10. 03
ⓒ BY KOLONMALL. ALL RIGHT RESERVED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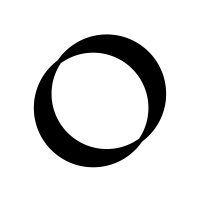

ⓒ BY KOLONMALL. ALL RIGHT RESERVED

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. 『아무튼, 스웨터』 (제철소, 2017)를 썼습니다.
첫번째 댓글을 달아보세요!